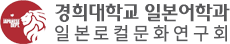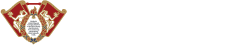- 캡스톤디자인
- 일본문학과영화
- 일본근현대명작선독
- 일본근현대문학의흐름
- 일본문학과동아시아
- 일본문학과영화
- 학술자료
일본문학과영화
|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비평 | |||||
|---|---|---|---|---|---|
| 작성자 | 양나래 | 작성일 | 2018.12.21 | ||
| 조회수 | 320 | 첨부파일 | |||
|
사랑'하는' 아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감독 나카시마 테츠야 * “정확하게 사랑받고 싶었어.” 이것은 장승리의 두 번째 시집 『무표정』(문예중앙,2012)에 수록돼 있는 시 「말」의 한 구절인데, 나는 이 한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고통을 자주 생각한다.
신형철, 『정확한 사랑의 실험』 부분

(나는 비록 신형철은 아니지만, 그가 한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고통을 생각하듯, 누군가의 일생을 관통한 사랑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처량하고 애잔하다. 친구들의 연애에서도, 영화나 책에서도. 사랑‘하는’사람은 작정하고 달려들어 처량해지곤 했다. 사랑 '받는' 사람과 사랑 '하는' 사람은 존재하는 방식이 달랐다. 필연적으로 단단히 어긋나있는 것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종종 안달 난 상태였고, 항상 야단을 맞았다. 맨발로 대뜸 달려 나가거나 비를 맞거나 때로는 사랑의 열병에 끙끙 앓으며 사랑‘하는’사람의 태도를 지켰다. 그 태도 하나, 겨우 그거 하나는 지켜냈다. 사랑의 수신자는 태연할 수 있었고 평정을 지킬 수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그건 멋있게 그려졌지만 사실 재수 없었다.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에서 마츠코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으로 운명지어 있는 듯 했다. 그녀에게 사랑은 불가항력의 것이었고, 마치 타자가 그녀에게 순식간에 들이닥쳐 그녀를 먹어치우는 듯 했다. 사랑의 폭력성을 지적했던 레비나스의 잠언들이 절로 떠올랐다.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은 쇼(에이타 분)가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며 시작한다. 전화는 행방불명되었던 고모 마츠코가 사체로 발견되었으니 그녀의 유품을정리하라는 내용이었다. 거의 무너질 거 같은 아파트에서 마츠코는 '혐오스런 마츠코'라고 불리며 살아왔다. 쇼는 마츠코의 유품을 치우며 그녀의 일생을 전해듣게 된다. 그녀의 일생에는 수많은 남성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쉽게 무너졌고, 하나같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그녀가 사랑하던 남자들은 자살하거나 그녀를 배반하거나 혹은 잊어버린다. 사랑에 상처받고 좌절한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하지만 그녀에게 사랑은 아주 일시적인 행복을 선사하는 것에 그친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상실하고 그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며 학대하던 어느 날, 작은 시비가 붉어져 폭행 당하고 죽고만다. 그것으로 마츠코의 일생이 끝난다. 그녀의 일생을 통과하고 있는 굵직한 사랑 이야기들은 형형의 색채들과 화려하고 환상적인 장면들로 시각화되며 상당히 극적으로 형상화된다. 그 가운데 마츠코는 행복과 불행의 양극단을 오간다. 그녀의 삶은 매번 그녀가 사랑했던 타자들에 의해 움직여왔다. 사랑하는 데에 있어 그녀는 한시도 머뭇거리지 않았고 그녀의 삶 전체를 내어주는 데도 서슴 없었다.
『사랑의 단상』은 주황색의 두꺼운 띠지를 두르고 있다. 띠지에는 굵고 까맣게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보다 작은 글씨로 하단에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적혀있다. 마츠코의 일생을 보고 나면 그녀의 삶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마구마구 생긴다. 그녀의 삶을 옹호하거나 대신해 변호하고 싶어지고, 그 나름의 가치를 찾아내 명명백백히 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떤 말들을 보태는 것보다,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을 관통하는 아픈 진실은 '사랑하는 사람은 다소 혐오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다. 아무래도 마츠코 대해서 말하는 일이란 사랑하는 일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듯 했다. 사랑 받는 사람의 아름다움과 행복에 대한 수많은 서사들이 넘쳐나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 또한 마냥 행복하게 포장될 때,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은 아픔, 고통, 무력함에 대해. 사랑에 빠져 사랑에 투신한 사람들의, 사랑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길 선택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영화가 사랑을 말할 때 선택한 특별한 결이 두드러진다.
우리의 사랑은 본디 하고자 함 자체부터 아픈 것, 떨쳐버리고 싶은 것, 죽이고 싶으나 죽일 수가 없는 것. 끊임없이 왜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되었는가 되묻고, 하루에도 벌컥벌컥 아프게 들이키는 것. 그러나 정확하게 사랑할 수 없고, 그 때문에 정확하게 사랑받을 수 없기에 더욱 아픈 것이기도 하다. 나와 사랑받는 얼굴과의 현저한 불균형은 언제든 나를 괴롭게 한다. 괴로움을 받아들이고 나면 사랑‘하는’사람은 사랑의 관계에서 진실로 휴식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게 될 것이다. (알랭 핑켈크로트, 『사랑의 지혜』, 「괴로움」 부분 인용, 변주)

마츠코의 사랑이 끝날 때 즈음, 그 배경은 어둡고 무섭고 외로웠는데, 사실 어둡고 무서운 배경, 외로움이라는 한 단어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하고 수많은 아픔들이 덕지덕지 발라진 배경이야 말로 우리 사랑의 배경일 거다. 우린 이미 거센 빗줄기 안에서 실컷 젖어버리고, 결국은 비가 싫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 배경 속에서 사랑한다. 비가 싫다는 마츠코의 독백은 사랑의 아픔이 싫다고 말하는 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다시 사랑하고, 다시 아프고, 다시 사랑하는 방식으로 누군가의 일생은 빼곡히 채워졌다.
사진은 영화 스틸컷입니다.
|
|||||
|
|||||
| Prev | 인랑 | ||||
| Next | <신 고질라> 비평 | ||||